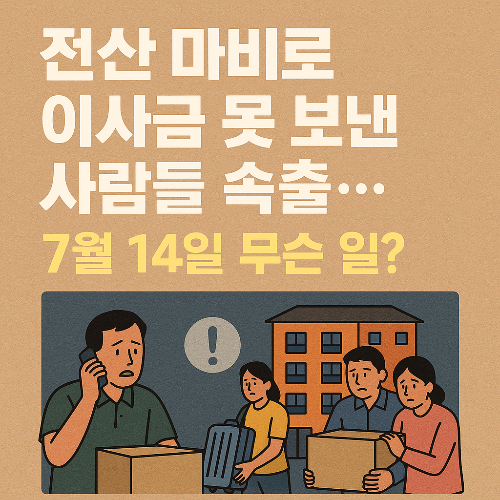전산 마비로 이사금 못 보낸 사람들 속출…7월 14일 무슨 일?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원래라면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짐을 푸는 날이어야 했던 이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전산 마비’. 특히 이날은 손없는 날이자 음력 6월 9일로, 전통적으로 이사나 혼사를 치르기에 좋은 날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사 예약이 몰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SGI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 일부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대규모 이체, 특히 전세 잔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 당일 잔금을 보내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전산망 마비, 단순 장애가 아니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시스템이 멈춘 것은 단순한 서버 오류나 내부 점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악성코드, 즉 랜섬웨어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된 것인데요.
보안 전문기관은 “이 사건은 명백한 사이버 공격으로, 금전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시스템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으로,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공격자는 시스템 복구와 관련된 대가로 수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손없는 날에 ‘잔금 정지’…피해는 어디까지?
피해는 단순히 돈을 못 보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삿짐을 싸놓고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했으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열쇠를 넘겨줄 수 없었던 집주인과의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이 무산되거나, 하루 이사비용 수십만 원이 공중에 뜬 사례도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왜 이체를 안 했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임시 거처를 급하게 구해 가족들과 찜통 더위 속 모텔이나 친척집에 머물러야 했고, 임신부나 노약자 등 이동이 어려운 이들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복구는 언제? 책임은 누구에게?
SGI 측은 당일 오전부터 전산 복구를 시도했으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사나 부동산업계, 소비자 모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라면 백업 체계와 이중 보안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금감원과 국정원도 사건 파악에 나섰고, 피해자 보호 방안과 보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체 불능이 낳는 사회적 리스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마비를 넘어, 디지털 전환 사회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융 이체가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 날이었죠.
특히 주택 거래와 같은 고액 이체는 단 몇 분만 늦어져도 계약 파기나 법적 책임이 따르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 시스템과 금융권 모두 사이버 보안 강화와 예비 시스템 마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4일은 단순한 여름날이 아닌, ‘이사 당일 잔금도 못 보내고 쫓기듯 움직여야 했던’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