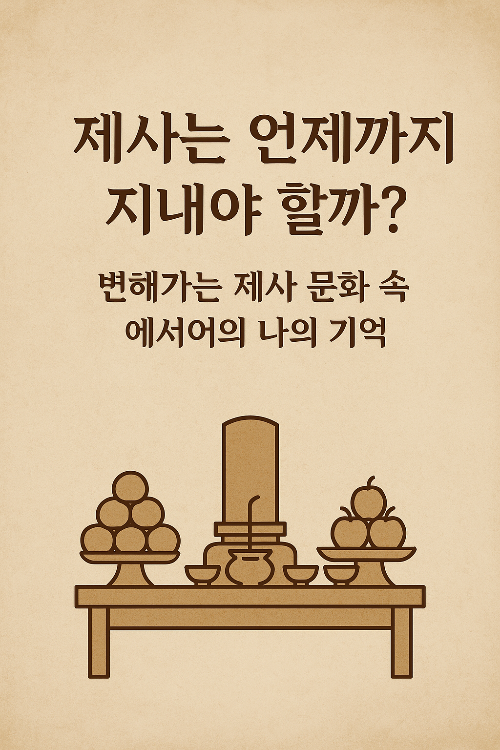어릴 적, 제사는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해마다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만큼 많은 제사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고 일상이었다.
시골 집성촌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이는 하나의 ‘행사’였다.
정성스레 상을 차리고, 일일이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던 그 시간은 당시에는 어른들의 몫이라 여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풍경 속에서 자란 내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상도, 사람도 많이 달라졌다. 집집마다 제사 문화는 점점 간소해졌고, 어떤 집은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기도 한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전엔 할아버지,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아버지 제사만 남겨두고 모두 없앴다.
부모님 세대도 점차 나이를 먹고, 자녀들은 제사를 유지하기보다 생전에 더 잘 모시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문득 생각하게 된다. 제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내야 하는 걸까?
정해진 규칙은 없다. 어떤 이는 4대 봉사까지 지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부모까지만 모신다고 한다.
심지어 제사를 아예 대신할 수 있는 '추모의 날'이나 '기억의 시간'을 가지는 집도 늘고 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진심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도시 생활과 핵가족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제사를 지내려면 장소, 음식 준비, 사람들의 이동이 모두 필요하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모여 사는 구조가 아니라면 제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평일 제사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되기도 한다.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없앤다고 해서 조상을 잊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따뜻하게 그들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맞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진짜 '기억의 제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한다.
그 안에서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전통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제사는 단지 제삿날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평소에도 고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오늘도 조용히 묻는다.
제사는 언제까지 지내야 할까?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명절 제사 준비: 삼색전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제사 전 붙이기
아버지의 제사준비제사준비와 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전’입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다양한 전을 부쳐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을 차립
phn1253.com